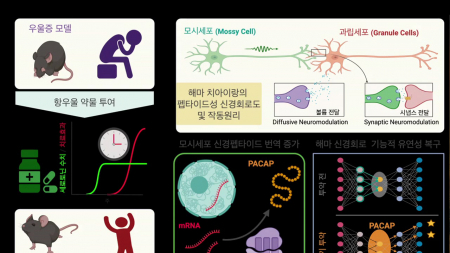[사이언스 레드카펫] 대중과 가까워진 K오컬트 영화 '파묘'…무덤, 인류의 역사 품고 식물의 피난처 되다
2024년 02월 23일 오전 09:00
■ 양훼영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자]
네, 오늘 영화는 일찍이 2024년 기대작으로 손꼽혀왔던 영화 '파묘'를 준비했습니다.
[앵커]
주연 배우들부터 감독까지 탄탄한 데다가 시사회 이후로 영화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져서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우선 영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영화는 무당 화림이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한 집안의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조상 묫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화림은 풍수사 상덕, 장의사 영근과 함께 묘가 있는 곳에 가보는데요. 악지 중의 악지,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땅에 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묘를 잘못 건드리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액의 의뢰금에 결국 파묘, 묘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고,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험한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영화는 총 6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중반까지는 오컬트 특유의 초자연적 현상이 이어지며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영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컬트라는 장르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장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재현 감독의 팬 혹은 오컬트 장르의 팬이 아닌 사람이 영화 파묘를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기자]
오컬트 영화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을 다루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오컬트가 그저 공포의 한 소재로만 소비돼왔는데,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 이후부터 K오컬트 영화가 새로운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74회 베를린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됐던 '파묘'는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물"이라는 호평도 받았거든요. 장재현 감독은 이번 영화를 두고 "좀 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재현 감독 특유의 강력한 오컬트물을 기대한 관객이라면 파묘의 후반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묘는 오컬트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관객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배우들, 무엇보다 신들린 듯 굿판을 연기하는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의 연기도 압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파묘가 풍수와 연관이 있을 텐데, 과학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대사에도 나오는데, 무속인과 풍수사들을 두고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를 과학이라 볼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풍수, 그러니까 명당 찾기가 시작된 건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지로 삼고 천도한 근거가 풍수지리였거든요. 이후 조상 묫자리를 찾는 풍수 수요가 늘면서, 어떤 묫자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문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영화에서 배우 최민식이 맡은 지관 또는 풍수사는 풍수지리에 따라 묫자리나 집터 등을 판단하는데, 이 일을 굳이 과학적으로 보자면 땅에 묻힌 유해가 별 탈 없이 썩어서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을 찾는 일이라고는 볼 순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영화에서는 과학 이야기를 다룰 게 뭐가 있을까요?
[기자]
묫자리를 정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과정은 과학이라고 볼 순 없지만, 무덤 그 자체는 굉장히 많은 과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덤을 통해 현생인류 초기부터 이어져 온 매장 방식이나 장례의 기원 등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의 한 동굴에서 7만8,300년 전의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 유아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무덤은 현생인류 무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요. 연구팀은 뼈를 감쌌던 흙을 분석한 결과, 시신을 매장한 뒤 나뭇잎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고, 재빨리 흙으로 덮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원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앞서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은 호모 날레디로 알려진 원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보다 최소 16만 년 전에 지하 동굴 두 곳에 시신을 의도적으로 묻고, 무덤 입구에 기하학 표식도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뼈의 방향과 토양이 교란된 형태를 볼 때 의도적으로 파낸 구덩이에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호모 날레디는 침팬지와 비슷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과 발 모양은 오늘날의 사람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모 날레디의 무덤 발견으로 큰 두뇌를 가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복잡한 행동이 훨씬 오래전 원시 인류에서부터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정말 오래된 무덤을 통해 인류 역사와 진화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인류뿐 아니라 무덤이 현재에도 생물학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 훼손이 심해진 상황에서 묘지가 희귀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폴란드 연구에 의하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장 많은 식물 종이 분포하는 곳은 당연히 식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로 나온 곳이 묘지 24곳이었습니다. 또, 터키 이스탄불의 한 묘지에서도 무려 280종의 고등 식물이 확인됐고요. 중국 허베이 성의 묘지 199곳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2㎡인 작은 묘지에서 12종의 식물이 자랐고, 전체 묘지에서 확인한 식물종은 모두 81종으로, 경작지의 식물종 34종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계명대 연구진이 멸종위기종이자 북방계 콩과 식물인 애기자운이 대구 인근에서 분포지를 이룬 건 무덤 덕분이라는 연구결과를 지난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대구 금호강 주변의 구릉 지대 무덤은 북방 분포지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1~2번의 예초 작업과 잡초 뽑기, 제초제 살포 등 인간의 간섭 등이 더해져 애기자운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식물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묘지, 무덤에 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검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가 아니라 무덤이 만들어진 뒤에는 최대 180년 동안 최소한의 교란만 이뤄지는 상태로 자연이 보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영화 '파묘'와 함께 무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무덤이 식물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앵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자]
네, 오늘 영화는 일찍이 2024년 기대작으로 손꼽혀왔던 영화 '파묘'를 준비했습니다.
[앵커]
주연 배우들부터 감독까지 탄탄한 데다가 시사회 이후로 영화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져서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우선 영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영화는 무당 화림이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한 집안의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조상 묫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화림은 풍수사 상덕, 장의사 영근과 함께 묘가 있는 곳에 가보는데요. 악지 중의 악지,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땅에 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묘를 잘못 건드리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거액의 의뢰금에 결국 파묘, 묘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고,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험한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영화는 총 6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중반까지는 오컬트 특유의 초자연적 현상이 이어지며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영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컬트라는 장르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장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재현 감독의 팬 혹은 오컬트 장르의 팬이 아닌 사람이 영화 파묘를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기자]
오컬트 영화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을 다루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오컬트가 그저 공포의 한 소재로만 소비돼왔는데,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 이후부터 K오컬트 영화가 새로운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74회 베를린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됐던 '파묘'는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물"이라는 호평도 받았거든요. 장재현 감독은 이번 영화를 두고 "좀 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재현 감독 특유의 강력한 오컬트물을 기대한 관객이라면 파묘의 후반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파묘는 오컬트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관객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배우들, 무엇보다 신들린 듯 굿판을 연기하는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의 연기도 압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파묘가 풍수와 연관이 있을 텐데, 과학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대사에도 나오는데, 무속인과 풍수사들을 두고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를 과학이라 볼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풍수, 그러니까 명당 찾기가 시작된 건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지로 삼고 천도한 근거가 풍수지리였거든요. 이후 조상 묫자리를 찾는 풍수 수요가 늘면서, 어떤 묫자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문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영화에서 배우 최민식이 맡은 지관 또는 풍수사는 풍수지리에 따라 묫자리나 집터 등을 판단하는데, 이 일을 굳이 과학적으로 보자면 땅에 묻힌 유해가 별 탈 없이 썩어서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을 찾는 일이라고는 볼 순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영화에서는 과학 이야기를 다룰 게 뭐가 있을까요?
[기자]
묫자리를 정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과정은 과학이라고 볼 순 없지만, 무덤 그 자체는 굉장히 많은 과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덤을 통해 현생인류 초기부터 이어져 온 매장 방식이나 장례의 기원 등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의 한 동굴에서 7만8,300년 전의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 유아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무덤은 현생인류 무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요. 연구팀은 뼈를 감쌌던 흙을 분석한 결과, 시신을 매장한 뒤 나뭇잎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수의를 입혔고, 재빨리 흙으로 덮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원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앞서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은 호모 날레디로 알려진 원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보다 최소 16만 년 전에 지하 동굴 두 곳에 시신을 의도적으로 묻고, 무덤 입구에 기하학 표식도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뼈의 방향과 토양이 교란된 형태를 볼 때 의도적으로 파낸 구덩이에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호모 날레디는 침팬지와 비슷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과 발 모양은 오늘날의 사람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모 날레디의 무덤 발견으로 큰 두뇌를 가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복잡한 행동이 훨씬 오래전 원시 인류에서부터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정말 오래된 무덤을 통해 인류 역사와 진화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인류뿐 아니라 무덤이 현재에도 생물학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 훼손이 심해진 상황에서 묘지가 희귀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폴란드 연구에 의하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장 많은 식물 종이 분포하는 곳은 당연히 식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로 나온 곳이 묘지 24곳이었습니다. 또, 터키 이스탄불의 한 묘지에서도 무려 280종의 고등 식물이 확인됐고요. 중국 허베이 성의 묘지 199곳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2㎡인 작은 묘지에서 12종의 식물이 자랐고, 전체 묘지에서 확인한 식물종은 모두 81종으로, 경작지의 식물종 34종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계명대 연구진이 멸종위기종이자 북방계 콩과 식물인 애기자운이 대구 인근에서 분포지를 이룬 건 무덤 덕분이라는 연구결과를 지난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대구 금호강 주변의 구릉 지대 무덤은 북방 분포지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1~2번의 예초 작업과 잡초 뽑기, 제초제 살포 등 인간의 간섭 등이 더해져 애기자운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식물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묘지, 무덤에 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검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가 아니라 무덤이 만들어진 뒤에는 최대 180년 동안 최소한의 교란만 이뤄지는 상태로 자연이 보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영화 '파묘'와 함께 무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무덤이 식물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